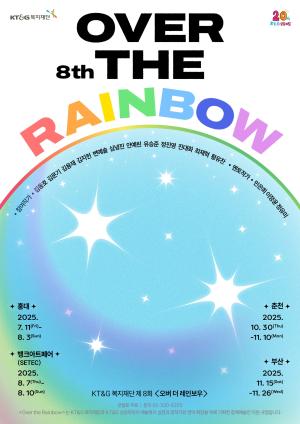[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려대 연구팀이 메조다공성(Mesoporous) 구조의 이황화몰리브덴(MoS2)을 전자 수송층으로 활용해 신개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고려대는 박혜성 고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러지에 이달 7일 게재됐다.
차세대 태양전지의 주요 소재로 손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우수한 광 흡수 능력과 전하 이동속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페로브스카이트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TiO2) 전자 수송층은 500°C 이상의 고온 소결(sintering) 공정이 필요하다. 또 빛에 노출되면 광촉매 반응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박 교수 연구팀은 기존 이산화티타늄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수송층 소재로 메조다공성 구조(기공이 미세다공성 물질보다는 크고 매크로다공성 물질보다는 작은 구조)의 이황화몰리브덴을 도입했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기존 이산화티타늄보다 비교적 저온(100 °C)에서 공정이 가능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격자 간의 간격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성장과 전지의 장기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메조다공성 구조의 이황화몰리브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소면적 소자(0.08cm²)에서 25.7%의 전력 변환 효율(인증 효율 25.4%)을, 대면적 소자(1.00cm²)에서 22.4%의 효율을 달성했다. 아울러 200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광조사 하에서도 초기 성능의 90%를 유지하는 등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대비 우수한 성능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박혜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메조다공성 이황화몰리브덴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자 수송층으로 적용함으로써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크게 높인 사례”라면서 “기존 전자 수송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