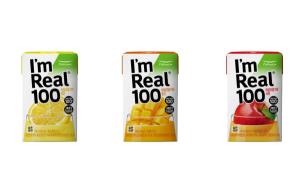[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명승엽 PD]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중심에는 태양광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다른 모든 신규 전기 에너지원을 합친 것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원자력 신규 설치용량보다 100배 더 빠르게 보급되며, 2025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풍력 등의 경쟁 기술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간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로 성장한 중국산 제품 견제로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4년여의 공백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미국 시장 투자를 이어가던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은 현지 정책 변화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간 지식재산권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n형 TOPCon 태양전지에 대한 글로벌 특허 전쟁이 활발한 모습이다.
#1. 한화솔루션, n형 TOPCon 글로벌 특허 전쟁 참전… 태양광 지식재산권 분쟁 ‘격화’

한화솔루션이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게 자사의 LECO (Laser Enhanced Contact Optimization)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통지서를 발송했다. LECO는 태양전지의 전기적 접촉을 강화하는 레이저 기술로, 2016년부터 독일의 장비 공급업체인 Cell Engineering이 p형 BSF 태양전지를 위해서 개발했다.
현재는 p형 PERC 및 n형 TOPCon 태양전지에도 적용 중이며, n형 TOPCon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하고 열화 감소에 기여해 최근 대세화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18년부터 상기 업체와 협력해 파일럿라인 적용 후, 2022년에 기술을 인수해 모든 생산라인에 적용하고 있다.
![LECO 컨택에 대한 스캐닝 전자현미경(SEM) 이미지(좌)와 모듈의 안정성 개선(우) [자료= (좌) PV Tech, 2024. 8., (우) X. Wu et al., Solar Energy Materials & Solar Cells 271 (2024) 112846]](/news/photo/202502/59796_67860_4144.jpg)
호주 UNSW 연구원들이 2024년 7월에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중국 Jolywood와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 공정인 Jolywood Special Injected Metallization (JSIM)이 TOPCon 태양전지에서 LECO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러한 유사 레이저 기술이 LECO 기술의 원천성 침해 여부가 향후 특허 침해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형 TOPCon 기술에 대한 글로벌 특허분쟁 [출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5. 1.)]](/news/photo/202502/59796_67861_4212.jpg)
한편, 중국 Jinko Solar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Shangrao Xinyuan Motion Technology Development는 중국 LONGi 상대로 n형 TOPCon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난창 중급인민법원에서 공식 접수한 이 사건은 2025년 2월 13일에 심리될 예정이다. Jinko Solar는 n형 TOPCon 기술 관련 462개의 업계 선도적 특허로 구성된 독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2,8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 미국 연방소유 토지, 5.8TW 유틸리티 태양광발전소 보급 잠재량 보유…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최종규칙 발표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최신보고서(Land of Opportunity :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on Federal Land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소유지에 7.7TW 이상의 유틸리티 규모 육상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소유 토지의 유틸리티 규모 청정에너지별 기술적 보급잠재량 [출처=NREL (2025. 1.)]](/news/photo/202502/59796_67862_4239.jpg)
2035년까지 미국 본토에 있는 총 연방 토지 면적의 0.5%만이 재생에너지 설치에 활용될 전망인데, 51~84GW의 신규 설치용량을 유치할 수 있다. 이는 전기 부문에서 넷제로 배출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약 10%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미국 내무부는 지금까지 국토관리국(BLM)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연방정부 소유지에 30GW가 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허가했다. 그러나 유틸리티 규모 육상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의 4%에 해당하는 8.9GW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석유 시추나 천연가스 생산에 연방정부 소유지가 보다 많이 활용됐다.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보급잠재량 [출처=NREL (2025. 1.)]](/news/photo/202502/59796_67863_4255.jpg)
NREL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는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기술적 보급 잠재량 5.8TW에 해당하는 4,400만 에이커(acres)의 광활한 면적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미국 비연방 토지는 유틸리티 태양광 69.9TW에 해당하는 기술적 보급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등 더욱 엄격한 입지 제약을 적용하더라도, 연방정부 소유 토지는 유틸리티 태양광의 경우 1.8TW, 해상풍력의 경우 70GW의 보급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로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한편, NREL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저수지는 0.9~1.0TW DC의 부유식 수상태양광발전의 기술적 보급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최소 77GW의 부유식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중립 세액공제(Technology-Neutral Tax Credits) 또는 IRA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세법 섹션 45Y에 따른 청정 전기생산 세액공제와 48E에 따른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풍력 및 원자력을 세액공제 대상 자격 기술 목록에 포함했다.
최종규칙은 전기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 목록을 변경하거나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명주기 분석 모델을 지정하려면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기관간 또는 기타 전문가와 협의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 공정(Life-Cycle Assessment, LCA) 탄소배출량 분석이 미국 시장에서 필수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규칙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기존 생산기술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 구조를 대체한다. 4년여의 공백을 깨고, 2025년 1월 20일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 탈퇴부터 선언했으니, 과연 이 최종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친환경 인류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IRA의 청정 전기생산 및 ITC에 대한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 보너스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미국산 웨이퍼로 생산된 미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자를 위한 선택적 대체 비용의 비율(백분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프로젝트에 국내 웨이퍼로 만든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비용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차장 카포트 및 부유식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등(선택적 급여 또는 직접 급여를 활용하는) 개조(retrofits) 사용에 대한 추가 명확성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추가 지침이 발표된 후 최대 90일 이내에 건설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이 발표에 대해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 예정인 한화솔루션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에게 좋지 않은 미국 소식도 있다. 노르웨이의 실리콘 소재 생산업체 REC Silicon이 미국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Moses Lake)에 있는 공장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REC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의 순도가 제3자 검증에서 한화솔루션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동 공장은 2019년 경영 적자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재가동하려던 곳이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 열위로 2020년에 여수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포기한 한화솔루션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등하자 2021년에 전격적으로 REC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2024년 4분기 동 공장의 생산 재개를 목표로, 한화솔루션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의 입자형(FBR) 폴리실리콘 생산량에 대한 10년 인수 또는 지불계약도 체결했었다.
결국, 한화솔루션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할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플랜B를 발표했다. REC는 대안으로 동 공장을 실리콘 가스생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850억원 수준의 지분투자를 실시한 한화와 한화솔루션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어서 타격이 예상된다. 양산에서 장기간 사용을 멈춘 태양광 업스트림 및 태양전지 장비의 원상복구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차세대 태양광 표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행보… 미국과 한국 폴리실리콘 수입 견제 목적의 반덤핑(AD) 관세 유지도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277.2GW AC로 2023년 216.9GW AC에 비해 연간 27% 증가하며, 모든 분석기관의 예상을 웃도는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고 한다. 2024년 12월 신규 설치용량만 68.3GW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들의 연간 신규 설치용량 총합도 상회한다.
중국의 연도별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AC)은 2020년 48.2GW, 2021년 54.9GW, 2022년 87.4GW, 2023년 216.8GW, 2024년 277.2GW로 최근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DC 기준으로는 2024년 300GW 돌파가 추정된다. 중국의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886.7GW에 도달하며, 연간 45%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24년 풍력 신규 설치용량은 79GW로, 연간 5% 증가에 그쳐 누적 설치용량은 520GW를 기록했다. 점점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용량 격차가 벌어지며 재생에너지 원별 투자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LONGi가 주도한 탠덤 태양전지 관련 표준 2건이 NEA에서 승인됐다고 한다. 승인된 표준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전압-전류(IV) 시험방법(NB/T 11736-2024)과 탠덤 태양전지의 양자효율(QE) 시험방법(NB/T 11735-2024)이다. 2025년 6월 25일 발효 예정으로, 중국 최초의 탠덤 태양전지 제정 표준이라고 한다.
동사는 상기 표준이 시험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제공해 시험기관과 기업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고, R&D와 생산 효율성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국내표준 제정에 멈추지 않고, 당연히 IEC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태양광 모듈 수출 제품에 대한 저탄소 평가 요건˼이라는 제목의 표준 초안을 공개 협의를 위해 발표했다. 태양광 모듈 수출의 저탄소 평가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데이터 품질 및 탄소발자국 계산을 포함해 태양광 모듈의 탄소발자국을 평가하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수출용 저탄소 모듈은 LCA 탄소배출량에서 재활용 등의 항목이 제외된 요람에서 관문(cradle-to-gate) 탄소배출량 415gCO2eq/Wp 이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듈의 탄소검증제에서는 LCA가 아닌 국가 표준배출계수를 적용한 탄소배출량을 적용하고 있는데, 모듈 제조만을 반영한 1등급 기준은 탄소배출량 630gCO2eq/Wp 이하이다. 따라서 향후 유럽과 미국 등의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산 저탄소 모듈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 당국과 업계의 긴장이 요구된다.
한편, MOFCOM은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일몰 검토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5년에 대한 조사는 2025년 1월 14일부터 시작돼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Sichuan Yongxiang Polysilicon을 포함한 13개 중국 기업이 2024년 11월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면 덤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상 미국 기업은 REC Solar Grade Silicon, REC Advanced Silicon Materials, Hemlock Semiconductor, MEMC Pasadena, AE Polysilicon Corporation 등이나, 현재 미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생산이 전무한 상태이다. Hemlock Semiconductor만이 미국 상무부(DOC)로부터 신규 공장구축을 위한 직접 자금 3.25억$을 최근 확보했다. 현재 관세율은 53.3~57.0%인데, 다분히 지난달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서 발표한 중국산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에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대상 국내 기업은 OCI Company Ltd., Korea Silicon of Hankook Silicon, Hanwha Solutions Corporation, SMP, Woongjin Polysilicon, KCC Corp, Korean Advanced Materials (KAM), Innovation Silicon 등으로 많아 보이나, 현재 생산은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관세율은 4.4~113.8%인데, 미·중 갈등이라는 고래 싸움에 OCI의 새우등만 터지게 생겼다.
#4. 태양광 중심의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변화 지속… 태양광 및 풍력 보조금이 글로벌 ‘trade-off’로 이어졌다는 OECD 분석도
![연도별 글로벌 청정에너지 설치용량 변화 비교 [출처=PV Magazine (ISES, 2025. 1.)]](/news/photo/202502/59796_67866_442.jpg)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최신 데이터를 분석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다른 모든 신규 전기 에너지원을 합친 것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설치되고 있다. 2024년 글로벌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용량 총합은 약 700GW로 추정된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원자력 신규 설치용량보다 100배 더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10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풍력 등의 경쟁 기술을 추월할 전망이다.

원자력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GW 수준으로 설치됐는데, 2024년에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전기차(EV) 등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5.5GW가 신규 설치되는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다. 석탄과 가스 발전은 2021년 이후로 정체되고 있는데, 2023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20년간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 제조환경 변화 [출처=OECD (2025. 1.)]](/news/photo/202502/59796_67868_4525.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새로운 무역 정책 보고서(Government Support in The Solar and Wind Value Chains)에서는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명승엽 태양광PD
지난 20년간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 산업은 혁신적 변화를 겪으며 밸류체인을 재편하는 한편, 과잉 생산·공급 집중·정부 보조금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풍력 터빈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추월했는데, 중국 태양광 모듈업체들은 상당한 정부 지원을 수령하며 글로벌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2023년부터 미국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이 야심찬 기후목표 달성과 공정한 시장경쟁 보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